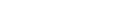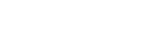한국고전번역원
공유하기
한시감상
2020년 11월 11일 (수)
이백열세 번째 이야기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칠월 칠석이라 가을 날씨 이른데
오동잎 소리에 먼저 깜짝 놀라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강남의 나그네
여관에서 잠 못 이루고 빗소리를 듣네
七月七夕秋氣早칠월칠석추기조
梧桐葉上最先驚오동엽상최선경
欲歸未歸江南客욕귀미귀강남객
旅館無眠聽雨聲려관무면청우성
- 정호 (鄭澔, 1648~1736), 『장암집(丈巖集)』권1, 「칠석(七夕)」
해설
정호가 함경도 유배 중에 지은 시다. 음력 칠월 칠석이면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지만, 이곳은 북쪽 지방이라 그런지 서늘하다.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는 걸 천하가 안다[梧桐一葉落, 天下盡知秋.]”라고 했던가. 오동잎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을을 실감한다. 고향 생각이 간절하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유배객 신세다. 마음이 착잡하니 잠이 올 리 없다.
정호는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송강 정철의 현손이다. 그는 1710년 함경도 갑산에 유배되었다. 당론을 일삼는다는 죄목이었다. 한때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한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함경도 땅을 밟았다. 당시 그의 나이 63세였다. 유배생활은 한두 해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갑산은 변방의 오지다. 이미 노쇠한 몸은 극변의 모진 날씨를 견뎌내기 어렵다. 이대로 이곳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다. 운이 좋아 일찍 이곳을 벗어난들 무엇하겠는가. 이미 정년퇴직할 나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읽던 주자(朱子)의 책을 꺼내어 일과를 정해 매일 읽었다. 때로 마음에 맞는 구절을 만나면 고달픈 신세를 잊기 충분했다. 두어 사람과 함께 읽으며 토론하니 읽으면 읽을수록 의미가 새로웠다.
노년에 유배지에서 다시 책을 손에 든 정호의 모습은 그의 선조 정철을 닮았다. 정철은 56세 때 평안도 강계에 위리안치되었다. 위리안치는 집 주위에 가시나무를 둘러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캄캄한 집안에서 정철은 『대학』을 읽었다. 소주(小註)까지 전부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 그것도 모자라 나무껍질을 벗겨 『대학』을 옮겨쓰고,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철은 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정호는 끝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선조 정철을 떠올리며 책을 집어들었을 것이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학잠(老學箴)>을 지었다.
사광(師廣)이 말했다.
“어려서 공부하는 것은 해가 처음 떠오르는 것과 같고, 젊어서 공부하는 것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과 같으며, 늙어서 공부하는 것은 밤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리고 젊을 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늙어서 배운다고 늦었다고 하지 말라. 밤에 촛불을 켜면 아무리 어두운 곳도 밝아지니, 계속 촛불을 켜면 햇빛을 대신할 수 있다. 촛불과 햇빛은 다르지만 밝기는 마찬가지이다. 밝기는 마찬가지이고 그 맛은 더욱 진실하다. 이 때문에 위 무공(衛武公)은 아흔 살에 시를 지었으니,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여 나의 스승이다.
師曠有言, 幼而學之, 如日初昇. 壯而學之, 如日中天. 老而學之, 如夜秉燭. 幼壯之學, 無以尙已. 旣老且學, 毋曰晚矣. 以燭照夜, 無暗不明. 燭之不已, 可以繼暘. 暘燭雖殊, 其明則均. 其明則均, 其味愈眞. 所以衛武, 九十作詩. 老而冞篤, 其惟我師.
늙어서 공부하기는 젊어서 공부하기보다 어렵다.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니 공부가 잘 될 리 없다. 하지만 노년의 공부를 방해하는 건 무엇보다 자포자기다. 이 나이에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정호는 갑산에 유배된 지 1년 만에 강원도 평창으로 유배지를 옮기고, 반년 뒤에는 완전히 풀려났다. 그의 나이 65세였다. 다시 환로에 오른 정호는 영의정까지 지내고 89세에 세상을 떠났다. 유배에서 풀려나고도 무려 24년이나 더 살았던 것이다. 갑산에 유배되었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이라고 포기했다면 말년의 화려한 성취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는 말은 치열하게 살라는 뜻일테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는 말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리라. 그런데 대개는 반대다. 영원히 살 것처럼 게으름을 피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공부를 쉽게 포기한다. 세월이 지날수록 후회만 쌓일 뿐이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운다면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을 것이다.
글쓴이 장유승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저·역서
『한국산문선』, 민음사, 2017(공역)
『일일공부』, 민음사, 2014
『동아시아의 문헌교류 - 16~18세기 한중일 서적의 전파와 수용』, 소명출판, 2014(공저)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글항아리, 2013 등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책" 메일링서비스의 수신한 글을 옮김
'♧ 마음이 머무는 곳 > ♣ 한시감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취종필(大醉縱筆) (0) | 2017.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