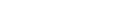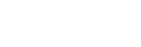한국고전번역원
고전명구
2022년 3월 23일 (수)
2021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 고전명구 부문 당선작
완전한 혼자라는 신화
"나는 그대가 언젠가 펼쳐질 것을 안다. 굽어 있던 것이 펼쳐지는 것은 이치의 형세이다."
吾知子之伸有日. 旣屈則伸, 理之勢也.
오지자지시유일 기굴즉신 이지세야
- 서경덕(徐敬德, 1489~1546),『화담선생문집(花潭先生文集)』권2 「김사신자사(金士伸字詞)」
해설
‘화담 서경덕은 별다른 스승 없이 자연과 홀로 마주하여 씨름하며 학문을 깨우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늘의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 天 글자를 벽에 붙이고서 면벽 수행을 하듯 깊이 파고들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한 그가 사망한 뒤 30년가량이 지나 조정에서 추증 문제가 거론되었다.
선조는 서경덕의 저서를 살펴보니 기수(氣數)에 관해 논한 바는 많으나 수신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했고 공부에 의심스러운 바가 많다며 우의정 추증을 내켜 하지 않았다. 그때 박순, 허엽 등 서경덕 아래 문인들이 항변했지만 이에도 선조는 끝내 의심스럽다며 주저했다. 그때 율곡은 서경덕의 공부는 배우는 자가 본받을 바가 아니고 성현의 뜻과는 거리가 있지만 깊이 생각하여 먼 곳까지 도달해 자득한 묘함이 많고 문자언어의 학문이 아니라고 말해주어 결국 우의정으로 추증되는 것이 허락된다.
어떤 이가 소위 관직과 거리를 두며 은일했다고 하면 외부를 향한 창을 굳게 닫은 채 독야청청, 홀로 안분지족하며 지냈겠거니 치부하게 된다. 그러나 율곡이 화담을 알아준 것처럼 화담 또한 그의 벗 김한걸이 재능을 품고서도 오랫동안 굽히고 있었음을 알아주고 그가 곧 선현의 공적을 좇아 뜻을 펼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등 창을 활짝 열고 다른 이를 알아보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할 것을 근심하라.’ 막상 내가 인정받지 못한 채 남을 알아주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미 몇 번이나 마음에 아로새긴 이 경구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시대가 각박해지고 일상이 조급해질수록 사회, 특히나 문화 경향은 개인 내부를 향하게 된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봐 안달이 나고 두려워져 남을 아는 것 또한 덩달아 꺼려지곤 한다. 내가 서경덕을 스승 하나 없이 홀로 고고했던 문인으로 남겨두고 싶어 한 것도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론 위안 삼을 고고한 천재가 필요해서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서경덕은 자신에겐 스승이 없어 공부하는 데 무척 고생했고 뒷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의지해 공부하면 힘들지 않을 거라고 늘 말했다고 하니 완전한 홀로라는 신화는 사실 몽상에 가까웠던 걸까.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굽은 것인 펴지기 마련이라는 말이 선사하는 뭉클한 위안이 나의 힘듦에 가려 잊고 지내는 친구와 가족을 떠오르게 한다. 마치 혼자서만 뜻밖에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버린 것처럼.
글쓴이홍부일
프리랜서 문학번역가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책" 메일링서비스의 수신한 글을 옮김
'♧ 마음이 머무는 곳 > ♣ 고전명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견고하다 하지 마라. 갈다 보면 뚫리는 법이니.-勿謂堅 磨則穿(물위견 마즉천) (0) | 2019.09.05 |
|---|---|
|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여 만 가지 변화를 살피라(惟心惟一 萬變是監) (0) | 2018.09.05 |
| 모르는 줄 모른다(원효(元曉, 617~686),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0) | 2017.07.27 |
| 타고나기는 쉬워도~ (0) | 2017.04.30 |
| 익숙함을 돌아보라 (0) | 2017.02.25 |